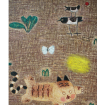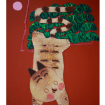대길오오-봄 72.7x60.6cm Oil on canvas 2020
금영보의 작품들은 번잡하고 목소리 큰 동시대 미술생태에서 가장 근원적인 조형성으로 자신만의 가치체계를 일궈내 보인다. 그의 화면에 주로 등장하는 호랑이나 말, 닭을 비롯해 사람들(어린왕자, 소녀, 아이들 등)은 해학성을 통해 현실로부터 어느 순간 이탈된 존재의 그림자이면서 이야기를 이끄는 서술자로 나타난다. 이들은 때로 주체이지만 또 다른 방향에선 시간과 조우하는 관찰자가 되기도 한다.
너무나 친숙하여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일상성을 담아내면서도 그의 작품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무엇보다 시각을 포괄한 ‘정서의 공유’부터 이뤄지는 양태는 그의 그림에 몰입하게 만드는 흥미로움이다. 그건 구상적인 표현으로 정겨움과 친밀함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정적이면서도 밝은 세계를 표상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탓이 크다.
실제로도 서툴고, 어수룩하게 보이면서 전혀 꾸밈이 없는 금영보의 작품은 살가움과 친근함이 우선한다. 질박한 색채, 익살스럽고 소박한 이미지, 장난기 가득한 호랑이와 우스꽝스럽게 생긴 말, 무심한 듯 놓인 까치며 오리의 형상도 형상이거니와 그 형상들의 취하고 있는 모습에서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물의 묘사에 선행되는 서술형 구조는 우리를 작품 자체와 마주하게 한다.
금영보의 작품들과 민화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은 외형에 있다기보다는 심리적 결부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전통문화의 한 유산으로서 단순하고 솔직하며 소박하게 표현해준 하나의 뚜렷한 장르인 민화와 작가의 본능적인 회화 의지와 욕구의 표출, 그리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생활 습속에 얽힌 순수하고 대중적인 지점에서 보다 깊은 근친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물 자체의 리얼리티에 대한 관심 혹은 표피적인 ‘닮음’과는 거리가 있다. 아니, 차라리 비지성적 부분 가운데 습관에 의해 지성적 부분으로 전향되는 감정적 능력인 에토스(ethos)와 가깝다. 작가는 이를 ‘풍토성’이라 칭한다.
풍토성, 그것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유지하는 풍토의 독특한 특색을 말한다. 풍토는 고유의 자연환경과 습관적-습속적 정서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딱히 규정하긴 어렵지만 공동체의 암묵적 테제를 바탕으로 한 자기이해 방식 아래 구현되는 개념이다. 이는 예술에서 자연적인 것들과 습관적-습속적 이미지로 드러나며 전적으로 시간성과 공간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그림들은 이리보고 저리 봐도 우리네 삶의 한 장면과 시대를 반추하는 ‘공감’이 개입이라는 공통분모가 녹아 있다.
금영보의 많은 작품들에서 알 수 없는 공감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상 ‘재현’으로서의 예술이라는 리얼리즘에 귀속되는 것도 한 몫 하지만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시간의 경계에서 서성이는 이미지들, 한국민의 익숙한 조형적 근간을 읽게 하는 한국인의 미의식과 정서에 침투하는 탓도 작지 않다. 특히 우리 정신과 마음속에 면면히 흘러온 미적 기질이 그의 낱낱의 작품들과 교배된다는 것이야말로 공감과 공유의 이유이다.
홍경환